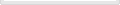|
БзЗЏИщ Бз ДйРН РЬОюСіДТ СњЙЎРЬ ПРАэАЁДТ БцРЬ ОюЖАГФДТ АЭРЬДй. БзИЎАэ НУДьПЁМРЧ РЯРЬДй.
НУДьРЬ МіПјРЬЖѓ БцРЬ ИЗШїДТ АцЧшРК БзДйСі ЧЯСі ОЪОвДй.
БзПЁ ЙнЧи ПЗ ТїМБРК СжТїРхРЛ ЙцКвФЩ ЧбДй.
БЙЕЕИІ РЬПыЧи СжЗЮ АЁБт ЖЇЙЎПЁ ИэР§ ДчРЯПЁ АјПјЙІПјРЛ АЁДТ РЮЦФПЭ ИТДкЖпЗС ЙаИА РћРЬ Чб Йј РжДй.
ЖЧ МГПЁДТ ЦјМГ ЖЇЙЎПЁ 3НУАЃ ГбАд ЙаИА РћЕЕ РжОњДй. ЧЯСіИИ Г ЧзЛѓ ЕЕЗЮИІ РќММГЛАэ ДйДбДйАэ ИЛЧбДй.
РЬЙјПЁЕЕ ДоЖѓСј АЭ ОјРЬ СІ МгЕЕПЭ СІ НУАЃРЛ Еќ ИТУпОњДй. БзИЎАэ ПЗ ТїМБРЧ РќЕюКвКћРК ЕЕЗЮРЧ И№ОчРЛ ИИЕщОюСжАэ РжОњДй.
НДЦлПьИеРЬ ОЦДЯДйКИДЯ РЯАњ ЛьИВРЛ АсФк Рп КДЧрЧЯСі ИјЧбДй.
БзЗЁМ АЁВћ ЁЎЖБНУЗчРЧ Р§ЙнРК ОўОњДйЁЏАэ ИЛЧЯИщ И№ЕЮ ПєАэ ИИДй. БзЗЏИщМ МгРИЗЮ Тќ ЧбНЩЧЯДй ЧЯДТ Л§АЂРЛ ЧбДй.
ГЛ РкНХ НКНКЗЮАЁ ГЛАд КйРЮ КАИэРК ЁЎБш МГАХСіЁЏРЬДй.
БзГЊИЖ Г МТТА ИчДРИЎРЬБт ЖЇЙЎРЬДй. АсШЅ 18ГтТїАЁ ЕЧЕЕ РННФРЛ ИИЕщ СйЕЕ ИРЕЕ Иј ГНДй.
ОюДР АЭ ЧЯГЊ РННФРЛ СІДыЗЮ ИИЕхДТ АЭРЬ ОјДй.
ОЦРЬЕщРЬ ХТОюГЊАэ УЪЕюЧаБГБюСіДТ ИэР§ПЁ И№РЬИщ МљАЁЖєРЛ 24АГИІ ГѕОвДй.
РННФРЛ ИИЕщЖЇКЮХЭ ПТ НФБИАЁ КЯРћРЬДТ АЭРЬДй. ОЦЙіДд АэЧтРЬ РЬКЯРЬЖѓ ФЃУДРЬ ОјСіИИ 6ГВИХРЬБт ЖЇЙЎРЬДй.
Йф ИдАэ ГЊИщ БнЙц СЁНЩ, РњГсРЬОњДй. МХѕИЅ ГЊДТ С§ПЁ ЕЙОЦПРИщ РдМњРЬ КЮИЃЦЎАэ ИіЛьРЛ ОЮБтЕЕ ЧпДй.
Тќ АэЕШ РЯРЧ ПЌМгРЬОњДй. 1Гт ЕЮ ЙјРЬДЯ ТќРкПДДй. БзИЎАэ ИчДРИЎЕщРК ГВЦэЕщРЬ ЧбОјРЬ ОпМгЧиМ ЛьБнЛьБн ГВЦэЕщРЛ НУФбИдОњДй(?).
ЙАЗа УГРНПЁДТ ОюИгДЯРЧ ОѓБМ ЧЅСЄРЬ ЙйВюОњСіИИ ИЛРЬДй.
ПьИЎ ОЦРЬЕщРЬ Дй РкЖѓ АэЕюЧаЛ§РЬ ЕЧОњДй.
Бз ЛчРЬ КЏЧб АЭРК ОЦЙіДдВВМ ЕЙОЦАЁНУАэ, НУДьРЧ СЖФЋ ОЦРЬ ЧЯГЊДТ ЙЬПыРЯ ЙшПьЗЏ ФЋГЊДй АЁАэ, СЖФЋОЦРЬ ЧЯГЊДТ КёИэПЁ ЧЯДУГЊЖѓПЁ АЌДй.
ИчДРИЎ ЧЯГЊДТ ПЯРќЧб ЕЖИГРЛ Чи СІ АЅ БцЗЮ АЁЙіЗШДй.
ПфСђРК РННФРЛ ИИЕщ ЖЇДТ ХЋ ОЦРЬЕщРК ФкЛЉБтЕЕ КёУпСі ОЪДТДй.
БзЗЏДйАЁ ИэР§ ОЦФЇРЬ ЕЧДЯ ПьИЃИЃ Дй И№ПДДй. ОЦФЇ ИдАэ ГЊРк ОЦРЬЕщРК ЧЯГЊ Еб Ш№ОюСГДй.
СЁНЩ СіГЊДЯ АсШЅРЛ Чб СЖФЋАЁ ЕўРЛ ЕЅИЎАэ ГЊХИГЕДй.
РњГсРЛ ТїИЎДТЕЅ 17АГРЧ МљАЁЖєРЛ ГѕРИИщМ ЁЎБзЛчРЬ ММПљРЬ ИЙРЬ КЏЧпБИГЊЁЏЧЯДТ Л§АЂРЛ ЧпДй.
ЁЎДй СіГЊАЁИЎЖѓЁЏ БзЗЈОњДй. Бз ДчНУДТ ГЁГЊСі ОЪРЛ АЭ ААОвДТЕЅ ММПљРК БзЗИАд ШхИЃАэ РжОњДј АЭРЬДй.
МјАЃРЛ СёБтРк ЧЯИщМЕЕ ЖЧ РиОюЙіИЎДТ ОюИЎМЎРНРЛ ХПЧпДй.
ИэР§РЧ Бз ТЅСѕНКЗЏПђАњ ШћЕщОюМ ИіЛьРЬ ОЮОвДј БтОяРЬ РЬСІДТ УпОяРЬ ЕЧОњДй.
БзЗИДйАэ ЦђОШЧб ЛѓХТРЧ ИэР§РК ОЦДЯДй. ДйИЅ РЯЕщЗЮ ИгИЎ МгРЛ БЋЗгШїДЯБю ИЛРЬДй. БзЗЁМ РЬАЭЕЕ СёБтРк, БзЗЏИщ ЖЧ ММПљРК ШхИЃГЊДЯ.
 2025.11.14(Бн) 20:21
2025.11.14(Бн) 20:21 БГРАХИРгСю СіИщНХЙЎ
БГРАХИРгСю СіИщНХЙ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