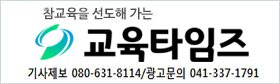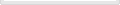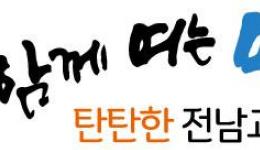|
ОчОЦЗЯРЧ СжРЮАј, РЬЙЎАЧРК РЯТяРЬ СпЧќ(ёъњќ) РЬУцАЧ(знѕїЫё)Ањ ДѕКвОю СЖБЄСЖ(№сЮУ№г)РЧ ЙЎЧЯПЁМ ЧаОїРЛ ДлАэ, 1513Гт(СпСО 8) СпЧќАњ ЧдВВ ЛчИЖНУПЁ ЧеАнЧЯПДДй. 1519Гт БтЙІЛчШЗЮ СЖБЄСЖАЁ ШИІ РдРк, ЙЎРЮЕщРЬ ШИІ ПАЗСЧи СЖЛѓ(№РпУ)ЧЯДТ РкАЁ ОјОњРИГЊ РЬЙЎАЧРЧ ЧќСІДТ ЛѓЗЪ(пУжЩ)ИІ ДйЧЯПДДй. РЬПЁ ГВАя(бѕЭх)ЁЄНЩСЄ(іияі)РЧ ЙЬПђРЛ ЙоОЦ, 1521Гт ОШУГАт(фЬєЅЬХ)РЧ ПСЛчПЁ ПЌЗчЕЧОю РЬУцАЧРК УЛЦФПЊ(єьїчцО)ПЁМ ЛчЛчЕЧАэ, РЬЙЎАЧРК ГЋОШ(фХфЬ)ПЁ РЏЙшЕЧОњДй. Бз ШФ 1527Гт(СпСО 23) ЛчИщЕЧОю РЬЕыЧи КАНУ ЙЎАњПЁ КДАњЗЮ БоСІ, НТСЄПј СжМПЁ ЙпХЙЕЧОњДй. РЬОюМ НТЙЎПј ЙкЛчИІ АХУФ СЄО№ЁЄРЬСЖ СТЖћПЁ РЬИЃЗЖДй.
БзЗБЕЅ ПЙРќРЧ ЧјРЧЗЮ ДыАЃРИЗЮКЮХЭ РгБнРЬ Лѕ АќПјРЛ РгИэЧб ЕкПЁ Бз МКИэ, ЙЎЙњ, РЬЗТ ЕћРЇИІ НсМ ЛчЧхКЮПЭ ЛчАЃПјРЧ ДыАЃ(гцЪп)ПЁАд Бз АЁКЮ(ЪІмњ)ИІ ЙЏДј МАц(пўЬш)РЬ АХКЮЕЧОњРИГЊ, БшОШЗЮ(ббфЬже)РЧ ЧљСЖЗЮ АќЗЮ(ЮЏжи)ДТ МјХКЧб РЮЙАРЬДй. 1539Гт РхБКРЛ ПЊРгЧЯИч АќБт ШЎИГПЁ ШћНшАэ, Бз Ек ХыЗЪПјПьХыЗЪ(їзжЩъТщгїзжЩ)ИІ АХУФ НТЙЎПј ЦЧБГАЁ ЕЧОю, СпСОРЧ БЙЛѓРЛ ИТОЦ КѓРќЕЕАЈ(оВюќдДЪј) РхАќРИЗЮМ ДыЛчИІ УГИЎЧЯПДДй. 1546Гт ИэСОРЬ СяРЇЧЯИщМ РБПјЧќ(ыХъЊћЌ) ЕюПЁ РЧЧи РЛЛчЛчШАЁ РЯОюГЊРк, ААРК МКРЛ АЁСј АмЗЙКйРЬ СЗФЃ(№щіб) РЬШж(зн§Ъ)АЁ ШИІ РдОњАэ, РЬПЁ ПЌЗчЕЧОю МКСжПЁ РЏЙшЕЧОњДйАЁ БзАїПЁМ СзОњДй. БзДТ МКЧАРЬ КЮСіЗБЧЯАэ ПТШФЧпАэ ШПМКЕЕ СіБиЧЯПДДй. РЬЙЎАЧРК 23Гт ЕПОШ РЏЙш Л§ШАРЛ ЧЯИщМ ПРЗЮСі АцЛч(ЬшоШ)ПЁ ХНДаЧЯАэ НУЙЎПЁ ШћОВДЯ, ЕкПЁ РЬШВ(знќб)ЁЄСЖНФ(№Цуе)ЁЄМКМіФЇ(рїсњік)ЁЄРЬРЬ(зньД) ЕюРЬ РЬЙЎАЧРЧ НУЙЎРЛ СёАм РМОњДй ЧбДй. Бз Ек УцКЯ БЋЛъРЧ ШОЯМПј(ќЃфмпіъТ)ПЁ СІЧт ЕЧОњДй.
РЬ ЙЎАЧРК РкНФРЛ ПЉМИ ИэРЬГЊ ГКОвСіИИ ДыКЮКа РќПАКДРИЗЮ ММЛѓРЛ ЖАГЕДй. АмПь ЛьОЦГВРК ОЦЕщ ЁЎПТЁЏРК ПКДРЛ ОЮРК ШФ ВїРгОјРЬ КДПЁ НУДоЗС БзОпИЛЗЮ ЧГРќЕюШПДДй. БзЖЇ ОђРК МеРк ЁЎМіКРРЬЁЏАЁ ОчОЦЗЯРЧ СжРЮАјРЬДй. РкЖѓИщМ ССРК РЯРЬ ИЙРЬ Л§БтЖѓАэ ЁЎМїБц(тзбЮ)ЁЏРЬЖѓДТ РЬИЇРЛ СіОюСжОњДй. ЧЯСіИИ МїБцРЮАЁ ЦјРНЧЯРк УЪ ИэРЮ МїБцРЬ СССі ОЪДйАэ Л§АЂЧЯПЉ Си ОІРИЗЮ АэФЁАэ ДйРН ЧиПЁ ДйНУ МіКР(сњмх), Ся ЙоЕщОю СіХВДйДТ РЧЙЬЗЮ АГИэЧЯПДДй. БзЗИАд ЛьЖуЧЯАд ХАПю МеРк РЬМіКРРК МКРЮРЬ ЕЧОю РгСјПжЖѕ ЖЇ ПьСЄФЇ(щряеік), РБПь(ыХщЮ)ПЭ ЧдВВ РЧКДРИЗЮ ХЉАд ШАОрЧпРИДЯ СЖКЮРЧ БтДыПЁЕЕ КЮРРЧпДй. ЧЯСіИИ РЬ ЙЎАЧРЧ ИЖСіИЗ РЯБтПЁДТ МеРкАЁ ФПАЁИщМ ОжСЄРЛ СжИщМЕЕ СіГЊФЁАд ОіАнЧЯАд БГРАРЛ Чи МеРкРЮ МіКРРК РЬЗБ ЧвОЦЙіСіРЧ ШЦРАРЛ ЕћЖѓАЁСі ИјЧЯАэ АпЕє МіАЁ ОјОю АјКЮИІ СЁТї ИжИЎЧЯАэ МњРЛ АЁБюРЬЧЯИч КёЖдОюСГДйИч ЧбХКЧЯИщМ ГыПЫСЖГыХК(жешК№твСїЃ)РЬЖѕ НУИІ СўАэ 'ДФРКРЬРЧ ЦїОЧЧдРК НЧЗЮ АцАшЧиОп Чв АЭРЬДй'ЖѓДТ РкНХРЧ ШЦРАПЁ ДыЧб ЙнМКАњ ЧдВВ 'ЧвОЦКёПЭ МеРк И№ЕЮПЁАд РпИјРЬ РжДй'Аэ НшДй.
 |
СЄЙЮСи БтРк jil3679@hanmail.net
СЄЙЮСи БтРк РдДЯДй.
|
 2026.02.16(Пљ) 00:34
2026.02.16(Пљ) 00:34 БГРАХИРгСю СіИщНХЙЎ
БГРАХИРгСю СіИщНХЙЎ